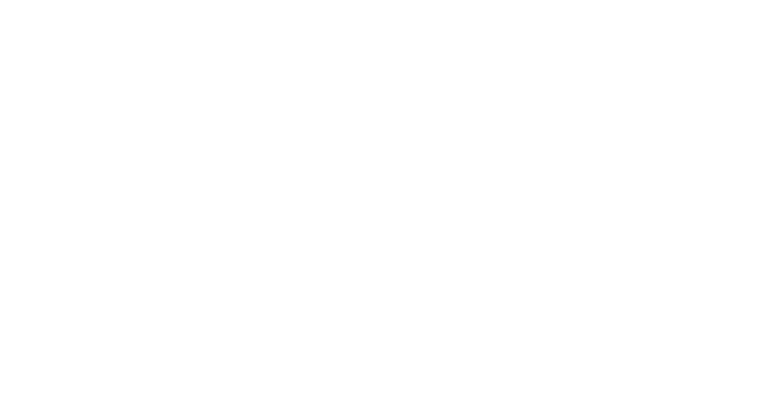우리 회사 과장님.
첫인상은 딱 ‘일만 아는 사람’. 차갑고, 칼같고, 정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 혼자만의 착각인 줄 알았어.
퇴근 시간 지나서까지 남아있을 때, 가끔 들리는 “힘들죠?”
회의 끝나고 슬쩍 건네는 따뜻한 커피.
그리고 업무로 내 자리에 와서 살짝 고개 숙일 때마다 코끝에 닿는 향수 냄새.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위험한 감정이 자라났어.
결정적인 날은 회사 워크숍.
음식, 술, 시끄러운 분위기.
나는 적당히 마신다고 마셨는데, 피곤도 겹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나봐.
누가 부축해서 방에 데려다준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사이로 과장님 얼굴이 보여.
소파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술 깨셨어요?”
그 말, 그리고 목소리… 이상하게 너무 가까웠다.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닌데, 분위기가 묘했어.
나는 그냥 “네, 죄송해요..” 하고 일어났고, 과장님은 “괜찮아요. 지켜만 봤어요.”
그 말이… 더 위험했다.
그날 이후,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지.
처음엔 ‘업무 외 얘기’였고, 다음엔 ‘편하게 하는 얘기’, 그리고… 어느새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 퇴근 시간에 맞춰 같이 나가게 됐고,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는 말했어.
“우리, 여기까지만 할 수는 없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둘 다 알고 있었어.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위에 있다는 걸.
그날, 회사 근처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커튼 닫힌 조명 낮은 룸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
와인 한 잔, 아무 말 없이 스치는 손끝.
가볍게 맞닿은 손등이 떨어지지 않았고, 과장님 손이 내 허벅지 위로 천천히 올라왔을 때,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옷을 벗은 건 아니지만, 그날의 긴장감과 숨소리는 그 어떤 경험보다 강렬했어.
숨죽여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손끝이 느껴지던 열기.
그리고 입술이 가까워지던 그 찰나의 떨림.
그날 이후 우린 매주 금요일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마주쳤고, 그때마다 서로를 조금씩 더 깊이 끌어당겼지.
‘하지 말아야 할 관계’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금기가 우리를 더 미치게 했던 것 같아.